
전북을 제약·바이오산업 허브로 키우자
옛 부터 전북(호남)은 한반도의 식량창고였다. 김제·만경의 끝없이 펼쳐진 넓은 평야가 그것을 증명한다. 조정래는 대하소설 ‘아리랑’ 첫 권에서 “한반도 땅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곳, 여기서 나는
곡식으로 이 땅의 목숨 7할이 먹고 살았던 곳”이라 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는 이곳에 발을 디딜 때마다 가이없이 넓은 벌에 무릎 꿇고 이마 대어 고마움의 절을 올렸다고 하지 않던가. 임진왜란 당시 백척간두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호남의 곡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만약 호남이 없다면 곧 국가가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했다.
이처럼 전북은 오랫동안 농도(農道)였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거치며 쌀의 운명과 함께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이제 농도 전북은 다시 슬슬 몸을 풀고 있다.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의 융복합이 각광을 받고, 농촌진흥청이 옮겨와 둥지를 틀면서 도약의 꿈을 가꾸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북 발전의 동력을 살펴보자.
단연 새만금사업을 들 수 있다. 이어 금융중심도시를 꿈꾸는 혁신도시 시즌2, 탄소산업, 식품클러스터,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등이 있다.
여기에 제약·바이오산업을 넣어, 미래 먹거리로 삼으면 어떨까. 천연물 신약을 포함한 제약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꼽힌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2020년 1조4000억 달러로 2007년 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반도체 세계 시장규모 4500억 달러를 3배나 뛰어 넘는다. 더구나 제약산업은 영업이익률이 전체 산업평균보다 5배나 높고, 10조원 매출 증가시 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만큼 고용유발효과가 크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제약·바이오산업을 34번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발굴·육성키로 했다.
전북은 이 같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적지다. 인프라가 어느 곳보다 잘 갖춰져 있어서다. 지리산 덕유산 변산반도 내장산 등 명산과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등이 키워온 풍부한 천연물과 서해안에서 건져 올린 해조류·어패류가 풍성하다. 완주 로컬푸드, 진안 홍삼, 임실 치즈, 순창 고추장, 장수 사과, 부안 뽕, 고창 복분자 등도 유명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린 농촌진흥청이 자리잡고 있다.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는1400명의 박사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식품연구원이 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익산으로 옮겨왔다. 또 종자산업의 핵심인 김제 민간종자연구단지, 익산 식품클러스터, 정읍 방사성육종센터와 미생물가치평가센터가 있다. 나아가 광활한 새만금지구에는 대규모 농업용지가 조성돼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농생명 수도’에 손색이 없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하게 될 제약·바이오산업은 전북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이 기대된다.
이 같은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재육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기본적으로 농업과 약학의 융합이지만 공학과 의학 수의학 등도 필수적이다.
결국 그 핵심에 약대가 깃발을 들고 인접학문이 유기적으로 돕는 구조여야 한다. 전북의 경우 원광대와 우석대 약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북대에 약대를 신설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신설 약대는 현행 왜곡된 약사 배출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된다. 즉 약대 졸업 후 80% 가까이가 개업하는 형태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처럼 연구 또는 산업약사를 주로 배출토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북이 제약·바이오산업을 통해 다시 한번 농생명의 르네상스를 펼쳤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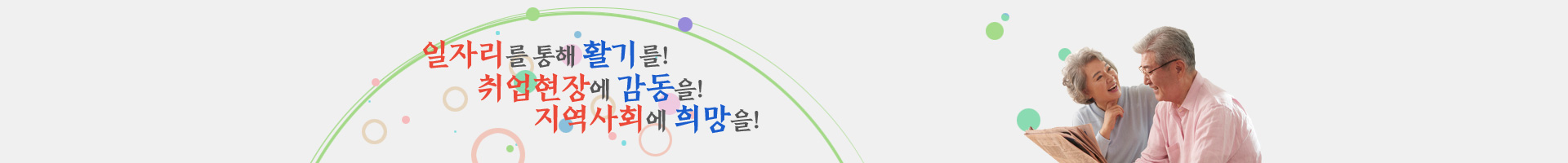
 자료마당
자료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