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박3일 간의 워크숍에 다녀왔다. 전국에서 노인 일자리 종사자 40여 명이 모인 전문과정 프로그램이었다. 모처럼 쉴 겸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었다. 몇 개 조로 나눠 조장을 뽑고 조별 발표과제가 주어졌다. 30∼40대 중간관리자가 대부분인지라 60대인 내게 조장이 맡겨졌다.
마지막 날에는 조별로 PT발표를 해야 했다.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빠지려 했다. 자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몇몇 조원들이 “(사무실에서) 나이 든 관장이나 센터장들은 밑에 있는 사람만 시키려 한다”는 말이 귀에 꽂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10분가량의 발표가 끝나고 평가를 하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메모지에 장단점을 써서 제출한 뒤 그것을 강사가 읽어주었다. 아뿔싸! 이게 웬일인가. ‘중후하다’ ‘경험이 많은 것 같다’는 평에 이어 “전형적인 아저씨 모습(꼰대)”라고 하지 않은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꼰대라니? 면전에서 처음 듣는 얘기였다. 웃고 넘어갔지만 내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후 그 말은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었다.
또 올해 들어 노인에 관한 글을 쓸 기회가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노인 또는 지역관련 단체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리액션을 보면서 “어른답지 못한 노인이 많구나!”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특히 “내가 (중책을)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봉사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15년 동안 감투를 쓰면서 단체를 지리멸렬하게 만들어 놓고도 아직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노인을 이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꼰대, 영감(令監), 늙은이, 노인, 어르신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꼰대는 청소년들이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은어였다. 지금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노인을 이른다. 영감은 당초 높은 관직에 오른 남자를 가리켰다. 후세에 내려오면서 사회적인 명사나 나이 많은 노인의 존칭 또는 부인이 자기 남편을 존대하는 말로 쓰였다.
그리고 어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2) 나이나 지위나 항렬이 높은 윗사람 3) 결혼을 한 사람 4) 한 집안이나 마을 따위의 집단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 이 가운데 3)을 제외하면 동의할 만하다.
하지만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늙은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언어에서 이 말은 비하의 뜻으로 인식되었다. 대신 노인이 가치중립적인 말로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다 1997년 ‘노인의 날’ 제정을 계기로 ‘어르신’으로 부르자는 제안이 있었다. 어른의 높임말로 노인공경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원래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한자로는 춘부장(春府丈) 춘당(春堂)이다.
요즘에는 노인(늙은이)과 어르신(어른)을 구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는 것 없이 받기만 좋아하면 노인이고, 대가없이 베풀기를 좋아하면 어르신이다. 더 이상 배울게 없다고 생각하면 노인, 그 반대면 어르신이다. 또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면 어르신이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귀와 주머니를 열어야 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결론은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에서 “주름살과 함께 품위가 갖추어지면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고 한 말이 딱 맞는 듯하다.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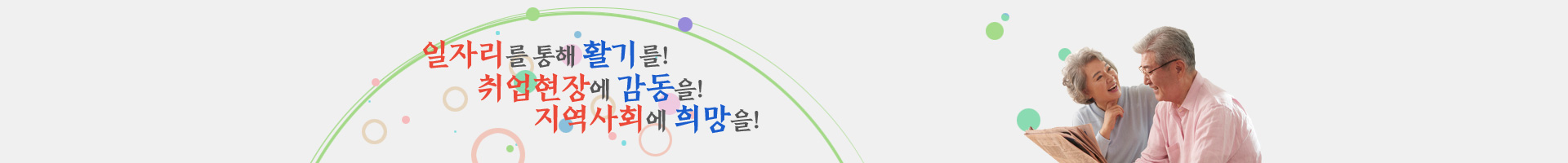
 자료마당
자료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