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흥미로운 통계가 발표되었다. 통계청이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이라는 국가통계를 개발해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민간소득과 정부재정 등이 0∼85세 이상 각 연령대 사이에서 어떻게 이전 및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정책을 개발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태어나서 28세까지 적자인생으로 살다가 29세부터 흑자인생으로 돌아선다. 이어 43세 때 정점을 찍고 58세부터 다시 적자인생으로 돌아간다. 즉 29∼57세의 29년 동안 뼈 빠지게 벌어서 유년과 노년을 먹고 사는 구조다. 크게 보면 부모가 교육비를 대주는 초반 30년을 빼고 중반 30년을 벌어서 중후반 60년을 사는 셈이다. 100세 시대의 라이프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주된 일자리의 평균퇴직 연령이 53세라는 점이다.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서든 건강을 위해서든 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인구는 2018년 12월 말 현재 7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55∼79세 사이의 64.1%가 일자리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률은 40%를 밑돌고 있고 그나마도 건물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주차관리, 운전, 요양원 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올해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는 61만개다. 지난해보다 10만 개가 늘었다. 이 중 취약계층 지원, 꽃밭가꾸기 등 공공시설봉사, 노노(老老)케어, 청소년 선도 등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공익형 일자리가 72.1%인 44만개로 가장 많다.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다. 이 같은 공익활동은 취업이라 하지 않고 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 부른다.
취업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는 시장형,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등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 특기할만한 것은 사회서비스형 2만 자리가 신설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장애인·노인시설, 방과후 학교 안전돌봄 등에서 한 달 60시간을 일하면 70만원 안팎(주휴수당 등 포함)이 주어진다. 이들 민간일자리는 모두 합해 17만 자리에 불과하다. 일자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의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 노인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 개발과 상담 및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관리, 교육훈련, 수행기관, 사후관리가 각각 분절(分節)돼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따로 따로 놀고 있어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나, 현재 있거나 나눌 수 있는 자리의 미스매치도 아주 심하다. 구직자와 구인처, 교육훈련과 취·창업간의 연계가 원활치 않고 구직자의 경력관리 등 DB도 엉성하다. 한 마디로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물 흐르듯 연결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가 광역자치단체별로 들어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더불어 복지와 고용의 중간 성격 일자리, 직업 중심보다는 직무 중심의 일자리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도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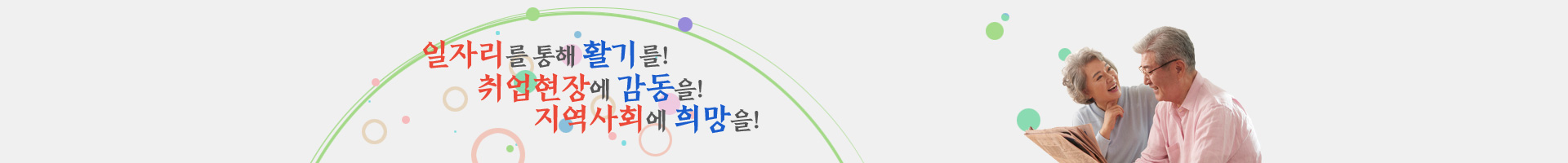
 자료마당
자료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