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순께 수원에서 열리는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여서 께름칙했으나 부득이 안 갈수 없는 처지였다. 당초 혼주는 결혼식을 미루려 했으나 터무니없는 위약금으로 최소한의 인원만을 초청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신랑신부와 혼주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마스크를 내리고 서로 파안대소하는 해프닝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가장 낯선 풍경은 식장 안에서였다. 150명가량 되는 하객들이 모두 흰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이란…. 박수를 치며 축하하긴 했으나 조금 무겁고 어색한 기운이 내내 감돌았다.
그 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마스크 착용은 일상사가 되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무례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지 100일이 넘었다.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안심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300만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20만명에 이른다. 이번 사태는 뉴욕타임즈 칼럼이 세계를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눌 만큼 역사와 사회를 확연하게 바꿔 놓았다.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아마 마스크 쓰기가 아닐까 싶다. 정부와 의료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2m 거리두기가 그것이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류가 짜낸 최고의 방책이다. 이 중 마스크는 시각적 효과가 커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도구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어쩌면 개인위생과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종의 넛지(nudge 주의를 환기시킴)인 셈이다.
마스크의 어원은 ‘마귀’라는 뜻의 중세 라틴어 마스카(masca)에서 유래했다. 또 다른 용어로 ‘가면’이라는 페르소나(persona)와 맥락을 같이 한다. 얼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마스크는 원시시대 종교의식에서부터 현대의 패션마스크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돼 왔다. 연극이나 무용의 분장도구로 사용되었고 14∼18세기에는 유럽에서 눈과 코, 얼굴의 반을 가리는 하프 마스크(half mask)가 유행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하는 기능성 마스크가 등장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한 장의 얇은 마스크에는 불안과 익명성, 비대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복지적 함의도 포함돼 있다. 우선 마스크는 크고 작은 재난이 그러하듯 불평등의 상징이 되었다. 빈곤이 주는 경제적 격차, 차별과 배제가 생명권의 격차로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 발생 초기 마스크 값이 폭등해 노인, 장애인, 난민,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미국의 경우 사망자 중 70% 이상이 흑인이다. 또 동양인이 마스크를 쓸 경우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반면 마스크는 타인에게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배려와 동시에 공존의 상징이었다. 기초수급자인 70대 노점 할머니가 마스크 39장과 틈틈이 모은 100만원을 대구의 어려운 분에게 보내달라고 파출소에 놓고 가는 등 사마리아인들의 선행이 잇따랐다. 마스크 양보 캠페인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코로나가 고비를 넘기면서 마스크 쓰기도 조금 시들해졌다. 마스크가 단절과 차단이 아닌 소통과 연대의 상징으로 기억됐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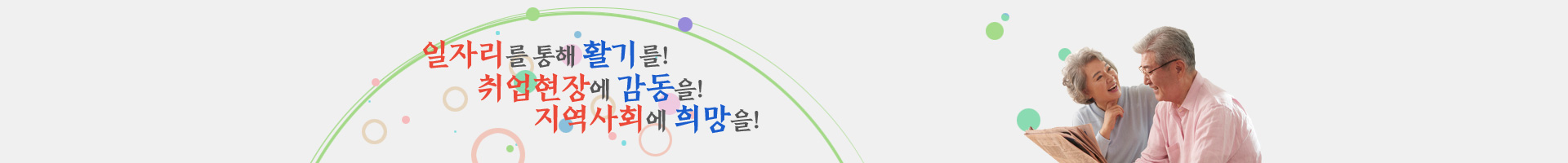
 자료마당
자료마당